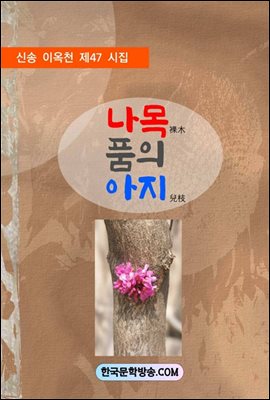상세정보

나 어쩌다 여기까지
- 저자
- 이정님 저
- 출판사
- 한국문학방송
- 출판일
- 2014-08-12
- 등록일
- 2014-11-04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5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육필시로 한 권쯤은 남기고 싶어 기존에 남겼던 시를 재편집해보았다. 내 시에서 김치냄새도 나고 된장냄새도 나는 그런 시였으면 좋겠다. 혹여 잘 썼다는 시 흉내를 내다가 향기를 잃을까 봐 두렵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성찬이 아니다. 나는 내 분수를 잘 알기에 그 분수에 맞게 계속 시를 쓰련다. 상대야 어떻든 자기만족에 취해서 온갖 알쏭달쏭한 말들을 다 동원해놓고 품위 있고 격조 높은 시 인양 평가의 잣대를 갖다 대는 시들을 대할 때마다 나는 성경의 유다서를 생각한다. “저희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 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모두가 피라미드의 정점만을 생각하며 시를 쓰지 않는다. 정점을 발치기 위해서는 바닥도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꽃과 벌 나비처럼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더불어 살며 감동을 줄 수 있는 생명들이 있었기에 내 시가 존재함을 안다. 앞으로도 비록 작지만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지도 하나 걸어놓고 더불어 사는 생명체와 소통을 꿈꾸며 겸손한 자세로 시를 쓰련다 ― 이정님 책머리글 시인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