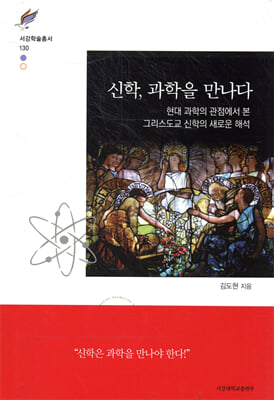리듬의 이론
- 저자
- 박슬기 저
- 출판사
- 서강대학교 출판부
- 출판일
- 2025-07-18
- 등록일
- 2025-08-22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3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노래가 지닌 파괴적인 힘에 대한 비유는 많지만, 이 모든 비유들은 아마도 세이렌을 그 기원으로 할 것이다. 뱃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아름답고 기이한 목소리, 노래를 듣는 그들은 어찌할 수 없이 자신의 죽음으로 이끌려 갔다. 세이렌의 노래가 이끄는 곳은 죽음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세이렌의 노래를 들은 모든 사람은 죽었으므로, 그 노래는 알려져 있지 않다. 살아남은 단 한 사람, 오디세우스 역시 노래를 듣지 못했으리라고 카프카는 적었다. 세이렌은 침묵했으나, 오디세우스는 노래하는 행위를 노래 그 자체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이렌의 노래가 어떠했는가를 묻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세이렌의 침묵이야말로 본질적인 노래다. 그것은 노래가 시작되는 장소인 근원이자, 그곳으로 이끌어 사유하는 주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재하는 노래 혹은 음악, 그것이 시이며 리듬이다. 횔덜린의 말을 따르면 인간의 운명이되 죽음의 운명인 것이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나는 리듬이란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문제를 잘못 설정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듬의 정의는 시의 정의와 다르지 않고, 시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모든 질문을 빠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에 도달하고자 하는 과정은 그에 걸려 있는 수많은 상식과 정의를 삭제해가는 것이었고 이 과정은 결코 답할 수 없는 어떤 최종 지점에 도달하게 했다. 그리고 도달하고서야 거기가 출발 지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시적 언어의 본질이자 인간과 언어가 맺는 근원적 관계의 장소다.
인간은 말하는 자로서 태어나며 말하는 자로 존재한다. 우리는 ‘나’라고 말할 때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안다. 나의 말을 통해서만 자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언어는 끊임없는 자기 확인의 언어다. 시적 언어가 다른 모든 언어와 다르다면, 말라르메가 말했듯 자기를 현시하며 어떤 본래적 경험 속에서 수행되기를 원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인간은 어떻게 이러한 언어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시를 쓰는 자가 확인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 자기 증명의 불가능성이다. ‘나’란 말 속에 놓인 거울에 되비치는 일종의 반향(反響)에 불과하다는 것, 이 치명적 경험이 시의 경험이자 리듬의 경험인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인간이 자신의 말과 글에서 계속해서 실패한다면 왜 이 실패를 반복해가며 쓰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 텍스트 그 자체가 아니라 시를 쓰고 읽는 인간의 존재 그 자체, 그의 경험의 총체성이다. 반복되는 글쓰기가 반복되는 죽음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시적 경험은 인간의 존재의 지평을 뒤흔든다. 사유하는 주체이자 언어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을 위협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리듬은 첨예하게 정치적이다. 본래적 죽음에 이르는 글쓰기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자신이 타자가 되는 진정한 공동체가 여기서 열린다. 나는 이 글에서 용어의 전환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리듬에 적합한 개념은 율(律)이라고 생각한다. 하늘의 법이자 인간의 운명이라는 본래적 의미로 말이다.
나는 이 글을 그야말로 더듬더듬 이어갔다.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 읽었던 그리고 이 글에서 인용한 모든 글들의 저자들에게 감사한다. 나의 글이 그들의 글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귀중한 조언을 들려주신 박재민, 김명준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두 분의 조언 덕분에 먼 길을 에둘러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실수투성이인 후배를 늘 아껴 주시는 이병기, 신서인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친구이자 동료인 최현희 선생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어쩌면 이 글은 내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비판과 격려로 다잡아준 그의 글이다. 생각보다 오래 이 글을 붙잡고 있었다.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신 서강학술총서 기획위원회와 서강대학교출판부에도 감사한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나는 계속 실패하고 다시 시작했다. 그것은 실패의 반복이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리듬처럼